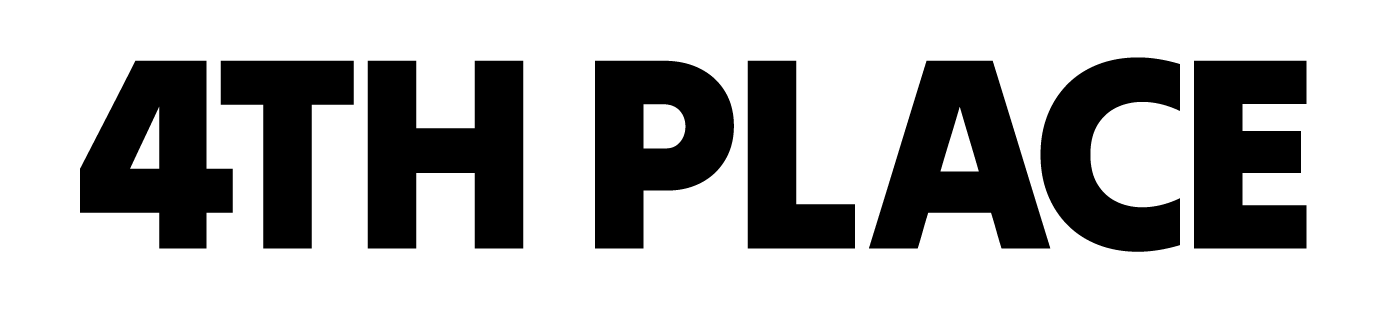개인적으로 많은 국가를 여행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방문했던 나라 중 제일 좋았던, 그리고 여러번 반복해서 방문했던 나라는 '몽골'입니다. 특히 고비사막에 방문했을 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지요.
농경사회에 기반한 우리나라와 달리 몽골은 유목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근간이 되는 문화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제가 고비사막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크게 2가지 였습니다. 반려동물 또는 가축. 그러나 고비사막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이런 관념을 크게 깨뜨려버렸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공생(共生)'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도 동물들은 인간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인간 역시 동물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지요. 인간과 동물은 같은 삶의 터전에서 동물은 인간에게 젖과 고기를, 인간은 동물에게 야생 동물로부터의 안전과 식량을 제공하면서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고비사막의 유목민의 삶에 한해서 그러하며, 울란바토르와 같은 도시 삶에서 동물 역시 주로 반려동물 또는 가축의 형태입니다.)




양과 염소들은 인가 근처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해가 질 무렵이면 저 멀리 어디선가 초원을 신나게 달리다가 돌아온 개가 양과 염소들을 우리 안으로 몰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은 없었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 사회 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렇다고 이 권리가 자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속에 근거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1762년)은 민주주의에 근간한 근대 국가 이념에 있어 주요한 개념 중 하나로, "사회 질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몽골 고비사막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어쩌면 원형(原形)일지도 모르는 형태의—암묵적 계약 또는 약속 관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의 암묵적 약속과 비극
지난 2023년 1월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2> ‘플라스틱 코끼리’는 스리랑카에서 코끼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비닐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뱃속이 막혀 죽어가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KBS 공식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KBS 공식 보도 자료
스리랑카 코끼리들, ‘플라스틱 코끼리’로...위장에 플라스틱 쓰레기 가득찬 채 죽어가는 이유는? (링크)
플라스틱 쓰레기에 중독된 코끼리들
쓰레기차가 한가득 실은 쓰레기를 쏟아붓고 떠나면 숲 언저리에서 기다리던 코끼리 무리들이 줄지어 새 쓰레기 더미로 몰려듭니다. 코끼리는 발달한 후각과 청각으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쓰레기차를 알아채고 마중 나가 성대한 식사 시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먹을만한 풀이 있는지를 찾고 그 이후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이 아닌데도 음식물이 묻어 있고 부드러워 삼키기 좋은 비닐류를 먹습니다. 죽은 코끼리들을 부검해보면 독성물질에 감염되었거나 위장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보호구역에 설치한 쓰레기 매립지, 비극의 시작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리랑카에는 약 6천여 마리의 코끼리가 있고, 해마다 코끼리와 인간의 충돌로 300여 마리의 코끼리가 죽으며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코끼리와 인간의 갈등 원인의 대부분은 쓰레기 매립지가 코끼리의 서식지나 이동 루트에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먹으러 오가는 코끼리들이 논과 밭을 망치고, 사람들은 불법 전기 펜스와 사제폭탄으로 대응하면서 그야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민주주의와 국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간의 계약 관계에 국한된 것이지요. 그로부터 260여년이 흐른 현재 2024년은 국가의 개념은 더 구체화되었고,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더 긴밀하고 복잡해졌으며 이에 더해 '지구 환경'이라는 새로운 계약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 개정된 인간과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계약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예술가이자 환경 운동가인 훈데르트 바서가 주장한 자연과의 평화조약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Peace Treaty with Nature (1983)
자연과의 평화조약
- We must learn the language of nature in order to reach an understanding with her. (우리는 자연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연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 We must give back territories to nature which we have misappropriated unlawfully and devastated,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everything which is horizontal under the open sky belongs to nature.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수평한 모든 것(지붕이나 길)은 자연에 속한 것이라는 원리에 따라 인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파괴했던 자연의 영역을 돌려주어야 한다.)
- Tolerance of spontaneous vegetation. (자연발생적인 식생에 대환 관용)
- The creation of man and the creation of nature must be reunited. The schism of these creations has had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nature and man. (인류의 창조와 자연의 창조는 재결합 되어야 한다. 이들의 분리는 자연과 인간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 Life in harmony with the laws of nature. (자연의 법칙에 조화되는 삶)
- We are only the guests of nature and must behave accordingly.
Man is the most dangerous pest ever to devastate the earth.
Man must put himself behind ecological barriers so that the earth can regenerate. (우리는 단순히 자연의 손님일 뿐이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인간은 지구를 파괴해온 가장 위험한 기생자이다. 인간은 자연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태적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 Human society must again become a waste-free society.For only he who honours his own waste and re-uses it in a waste-free society transforms death into life and has the right to live on this earth.Because he respects the cycle and allows the rebirth of life to occur. (인간사회는 다시 쓰레기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쓰레기를 존중하고 재활용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삶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환을 존중하고 생명이 재생하여 지구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